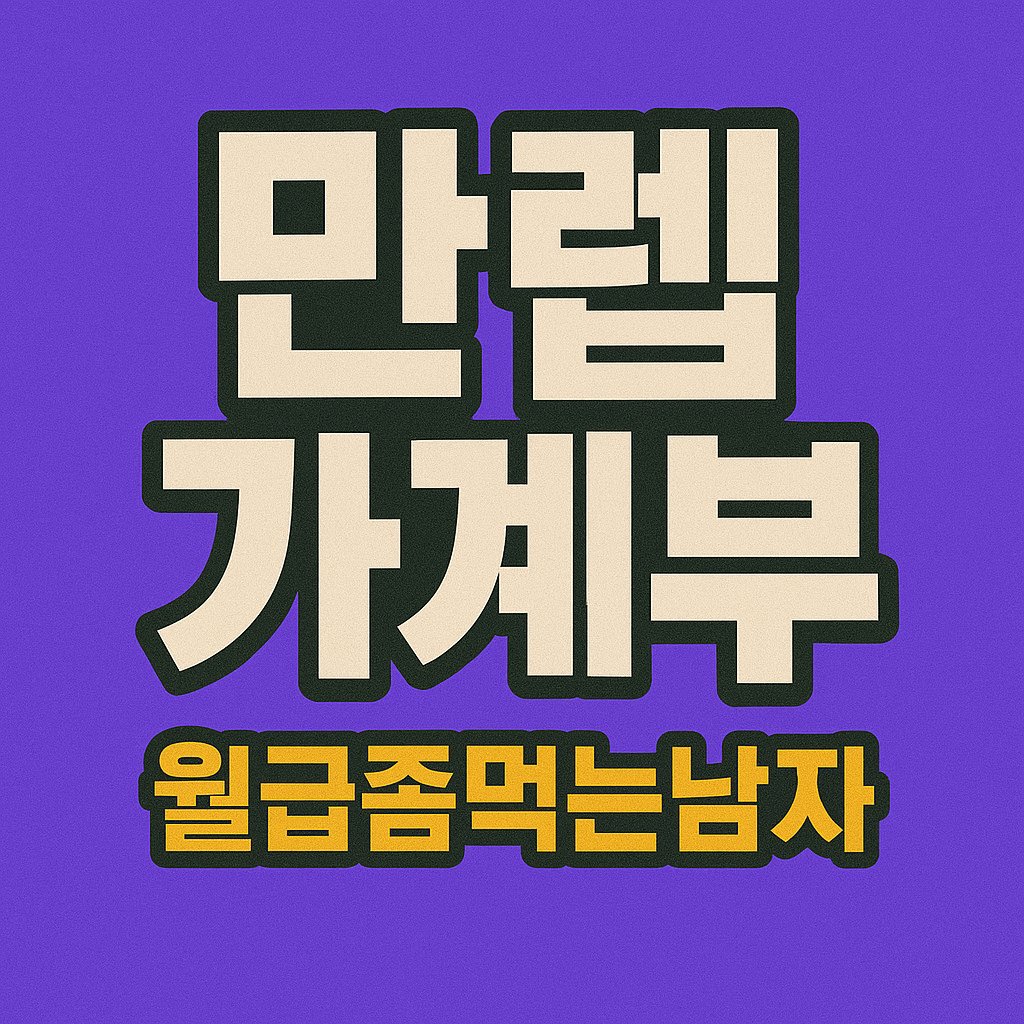“장사는 안 되고, 사람은 안 오고, 빚은 늘고…”
2025년 현재 자영업자들이 가장 자주 하는 하소연입니다.
특히 50~60대 퇴직자들이 생계형 창업에 몰리면서,
자영업은 과잉 경쟁과 내수 불황, 인건비 상승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

한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연령층은 50~59세, 약 870만 명입니다.
이들 중 다수는 평균 퇴직 연령인 52.8세를 앞두고 있으며, 정년 60세 이전에 퇴직을 경험하게 됩니다.
퇴직 이후엔 국민연금 수령까지 6~10년의 공백이 있으며, 자녀 결혼, 학비, 주택 대출까지 겹치면서 선택지가 줄어듭니다.
결국 "장사라도 해야지"라는 말이 일상처럼 들리며, 창업은 퇴직 후 자연스러운 수순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.

은퇴 후 가장 많이 선택하는 자영업.
그러나 자영업 시장은 사상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.
2025년 5월 기준, 자영업자 대출은 1,112조 원을 넘고, 3명 중 2명이 빚을 지고 있습니다.
경기도 음식업 영업이익률은 2018년 20%에서 2025년 현재 5.5%로 떨어졌고, 50대 자영업자의 49%는 최저임금도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. 연 매출 2억 원 이하의 자영업자가 과반을 차지하며, 연간 영업이익은 약 2,500만 원에 불과합니다.

자영업자의 65%는 고령층입니다.
경험 없는 업종에 전 재산을 걸고 뛰어드는 50대.
그 결과, 동일 업종 경험 없이 창업한 고령 자영업자의 83%가 최저임금 미만의 소득에 머물러 있습니다.
그러나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.
재취업은 쉽지 않고, 공공 일자리도 한정적이기에 많은 이들이 생계형 창업을 유일한 출구로 여기고 있습니다.

정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저금리 보증 대출, 만기 연장, 희망리턴패키지 등 재기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.
그러나 상환 유예는 2025년 9월까지만 가능하며, 이후 연장은 불확실해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.
50대 이후의 삶은 최소 20~30년이 남아 있습니다.
단기 대출 유예가 아닌, 개인연금·소득 다각화·직무 전환 훈련·지역 일자리 개발 같은 장기적 시스템 전환이 절실합니다.
무엇보다도 자영업 외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안전망 확보가 필요합니다.

이 시대 50~60대는 선택해서 창업한 것이 아닙니다.
가족을 위해, 노후를 위해 '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' 길을 걸은 것입니다.
하지만 지금의 구조는 이들을 '고위험 저소득 노동'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.
이제는 이분들의 제2의 인생이 실패가 아닌 존중받는 여정이 되도록, 정책과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.